-문제의 본질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단기 과제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 △사진=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원 내린 1,475.2원으로 개장했다.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발언은 불과 하루 만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로 뒤집혔다. 정책 판단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변화에는 명확한 논리와 설명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정책 당국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는 곧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으로 돌아온다.
문제의 본질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단기 과제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중장기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분명 가야 할 길이다.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키우는 일은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장기’가 현재의 불안을 외면해도 된다는 면허는 아니다.
환율은 심리다. 그리고 그 심리는 숫자보다 메시지에 먼저 반응한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규제 완화라는 정책 패키지가 환영받으려면 그 전제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한 부처에서 하루 사이에 상반된 발언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정부도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먼저 읽는다.
더욱이 고환율은 단지 외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국가 신용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정부 스스로도 고환율 상황에서는 대미 투자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이는 환율이 우리 경제의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상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어느 토끼를 먼저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벨트다. 선진국일수록 위기 국면에서 시장을 방치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금융 안정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시장은 정부의 말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말이 바뀐 횟수만큼 신뢰는 깎인다. 환율 앞에서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은 경제의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향타를 잡은 손이 망설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일관된 판단과 책임 있는 설명이다. 경고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책의 자세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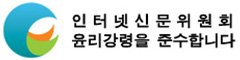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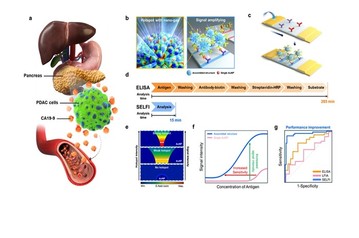


















![[포토]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힘입어 강원 영월군 청령포에 관광객 발걸음 이어져](/news/data/20260309/p1065543874851767_488_h2.jpg)
![[포토] 제107주년 3·1절 기념식…李대통령 "국가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news/data/20260302/p1065542393907288_162_h2.jpg)
![[포토] 고물가 시대, 명절 장보기…마트와 전통시장, 실속소비가 대세](/news/data/20260217/p1065543763827342_52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