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직접 뒷받침할 제도적 개편은 보이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볼 수있는 여지를 남긴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헌법의 수사나 애국가의 가사보다,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어디에 쓰는지가 그 나라의 영혼을 드러낸다.
 |
2025년 세법개정안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좌절에 이어 배당소득세 인하, 양도세 완화가 이어졌다.
집권여당이 당정 합의안마저 재론하겠다고 나서는 이례적 장면까지 벌어졌다. '코스피 5000'이라는 구호는 공공성인지 특정 집단의 이해인지 모호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 다수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정작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고금리·고물가 속 가계부채는 한계에 다다르고, 지역 소멸과 청년 주거난, 고령층의 빈곤은 갈수록 심각하다.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적 삶의 영역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 어디에도 이런 민생을 직접 뒷받침할 제도적 개편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세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청년 일자리와 교육 지원, 노인·아동 돌봄 강화, 의료 안전망 확충 모두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유럽이 경기부양책에서조차 교육·복지·의료 투자를 핵심으로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법은 민생정책의 토대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성장’과 ‘시장 활력’만을 반복한다.
정부 설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수십 차례 나오지만 ‘국민 삶’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조세지출 역시 민생보다 기업 감세에 무게가 실려 있다. 카드 소득공제 같은 비효율적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세제 개편은 외면한다.
세금은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삶을 보장할 것인지의 선언이다. ‘코스피 5000’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세법은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을 드러낸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세법에는지금, 국민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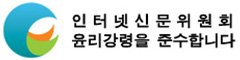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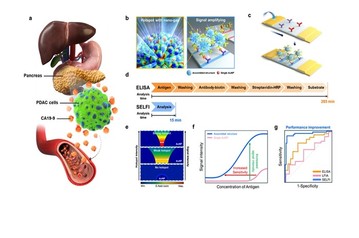


















![[포토]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힘입어 강원 영월군 청령포에 관광객 발걸음 이어져](/news/data/20260309/p1065543874851767_488_h2.jpg)
![[포토] 제107주년 3·1절 기념식…李대통령 "국가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news/data/20260302/p1065542393907288_162_h2.jpg)
![[포토] 고물가 시대, 명절 장보기…마트와 전통시장, 실속소비가 대세](/news/data/20260217/p1065543763827342_52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