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너나 조용히 해, 이 사가지 없는 XX야! 임산부도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어"
서울지하철 9호선 객차 안. 30대 초반의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바로 앞에 서있는 노인을 향해 고함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다.
일명 '9호선 막말녀'라고 불리는 이 여성의 동영상은 네티즌의 광클릭 세례를 받으며 삽시간에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보다 앞서 '지하철 폭행녀' '막말남' '패륜남' 등 우리는 숱한 '지하철 ○○남/녀' 시리즈를 접한 바 있다. 더욱이 이같은 '지하철 ○○남/녀' 동영상의 당사자들은 동영상 유포 후 네티즌에 의해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니 반복되는 '○○남/녀' 동영상을 한 개인의 부도덕한 작태로만 치부하기에 개운치 못한 뒷맛이 남는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같은 악습의 반복은 사회구조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생계를 유지하는데 바쳐왔다. 그런 와중에 사람의 '도리'는 도덕책에서나 나오는 케케묵은 관념정도로 뒷방으로 내몰렸다.
이 때문에 현대인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동력 또한 잃은 채 흔한 비유로 '다람쥐 체바퀴 돌듯' 빠듯하게 연명해왔다. 그결과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그 풍요를 나눌 조그마한 인정은 져버린 채 흉흉한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다소 엉뚱한 상상이지만 역사의 초침을 현재가 아닌 조선 후기 이기론(理氣論)의 시각으로 돌려보자.
이기론은 우주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서 존재하는 모든 형태 등을 '기(氣)'로 보왔다. 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나 의식에 의해 일정한 법칙이나 원리에 따라 변하는 것을 정신세계로서 '이(理)'라고 규정했다. 이를 사람에게 대입하면 육신은 물질의 형태이므로 '기', 마음은 정신의 세계로 '이'라고 나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이기론에 대한 논쟁은 인성교육의 중심을 이와 기 가운데 어디에다 방점을 찍는가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이'는 사람마다 가진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교육하자는 것으로, 도덕성을 바탕에 두고 접근하자는 논리다.
반면 '기'는 사람의 본능, 다시말해 희·노·애·락·미움·욕심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교육의 중심에 두자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기론자들은 이같은 이와 기의 상호작용이 세상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보자. 우리는 매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먹고사는 물질의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해왔다. 그 결과 훈훈하고 넉넉한 마음은 마치 배부른 자의 사치처럼 매도하거나 무시해 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목적과 합리적인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관습으로 이어졌다.
단적인 예로 '이'와 '기'가 조화로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상상해 보라. 머리 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는가? 반면, 핵전쟁 등 어떤 이유 등으로 '이'와 '기'의 조화가 무너진 '디스토피아'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는 경쟁이 최우선인 사회에 사는 현대인이면 누구나 낙오자로 전락해 '폐기처분'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른 결과다.
흔히 '늑대소년'이라 불리는 소설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는 야생동물에 의해 길러져 그 동물처럼 행동했다. 실제로 1920년 인도의 밀림에서 구출된 2세 아말라와 7세 카말라는 늑대처럼 행동하고 날고기만 먹었다. 또 2008년 러시아에서 새집에 갇혔다 구출된 반야라딘이라는 소년은 손을 쪼거나 새처럼 날개짓을 하는 등 새의 습성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외관은 사람이지만 자신이 누군인지 정체성을 잃은 채 사람다움을 저버리는 이같은 행동 양식을 '모글리 현상'이라 부른다.
'9호선 막말녀' 등 지금까지의 '○○남/녀 시리즈'를 지켜보면서 오직 물질만이 최우선인 이 사회의 구조가 우리를 '모글리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쟁과 생존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를 아껴주지 못한 채 더욱 우울하고 파괴적인 다툼만을 일삼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대웅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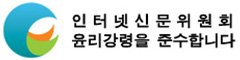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