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를 오가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르게 되는 수완나폼 공항의 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반도 중앙에 위치한 이곳은 지리적 여건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동남아의 허브다. 면적으로 보면 이웃나라 미얀마가 조금 더 크지만 태국은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동남아 최대 강국인데다가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이므로 전통문화가 원활하게 보존되고 있다.
태국이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세력 사이에 완충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입지도 있었지만 침략자들과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안정된 정국을 유지한 지혜로운 타이 왕실의 근대화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지금도 태국 사람들은 왕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존경해 도로 곳곳에 왕과 왕비의 대형 초상화가 설치돼 있다.
처음으로 태국여행을 했을 때는 가족과 함께 전통 공연, 코끼리 쇼, 무에타이쇼, 트랜스젠더의 티파니쇼 같은 것을 봤다. 이 때 머리에 황금 빛 관을 쓰고 기다란 손톱 장식을 한 무희들의 춤, 처녀 총각들이 추는 대나무 막대 춤과 북춤 등을 봤는데 이국적인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방콕의 ‘밤의 쇼’를 보고는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출가하는 신성한 국가 ‘태국’이라는 이미지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이용한 음탐한 돈벌이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몇 년 후, 2008년 태국 동북부의 마하사라캄(Mahasarakham) 대학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민속음악학회에 참가하게 됐다. 이때 마하사라캄 대학 전통예술단의 공연과 인근 지역 로이에 예술대학(Roi-et College of Dramatic Arts)과 라자바트(Rajabhat) 대학의 전통 예술단의 공연을 봤다. 방콕의 상업적인 공연과는 달리 풍요롭고 영화(榮華)로운 나라였음을 느끼게 한 이 공연으로 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지울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의 힘이 아니겠는가.
마하사라캄과 로이에는 태국 북동부 지역의 도시들인데 이 지역 고원에는 앙코르와트 시대의 크메르 유적이 산재해 있다. 라오스에서 2시간 정도 내려오면 닿는 기름진 골짜기 로이에, 그 유명한 황금사원과 민속 박물관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경관까지 고전도시의 풍모와 전통 문화의 면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의 발길이 드물어 ‘숨겨진 보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특히 이곳에서 열리는 로켓 축제, 목화꽃 축제, ‘피타콘 축제’는 볼거리가 화려하다. 6월에 열리는 불교 축제 ‘피타콘’ 때는 매일같이 계속되는 음악 행진이 이어지는데 이들의 악기 소리며 춤과 광대 짓이 토속 종교와 어우러진다. 이 지역 각 대학에 속한 전통 예술단이 가지각색 악가무로 축제를 장식하고 있었다. 세 개의 대학 예술 공연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로이에 예술대학’이었다.
음악, 춤, 연극, 드라마 제작까지 공연예술 모든 방면의 인재를 육성하는 태국 최고의 예술 명문대학이다. 강당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들려오는 악대들의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머리를 틀어 올리고 화려한 장식을 한 전통 무복을 입은 무희들이며 악기를 울러 맨 악사들이 열을 지어 등장하는데 악기의 생김생김이 신기하고도 특이했다. 마지막으로 징 잡이가 들어오는데, 막대에 징을 메달아 두 사람이 울러 메고 한 사람이 뒤 따라 오며 징을 쳤다. 징채를 빙빙 돌리며 징~ 징~하고 치는 모습이 마치 앙코르와트 벽화 속의 악사들이 걸어 들어오는 듯 했다.
전통 복장을 한 악사들이 무대에 앉자 한 바탕 흐드러진 음악이 연주되고 이어서 무용단이 등장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총각들은 웃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맨발로 춤을 추며 동네 처녀들과 어우러진다. 여자들도 어깨와 가슴골, 종아리를 다 내 놓았으니 북을 치느라 팔을 들면 겨드랑이가 다 보이는지라 동방예의지국(?)에서 오신 한국 어르신들은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신다.
한국의 궁중악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느라 움직이는 손 모양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해금의 주아에 가리개 장식을 했고, 여인들은 색동저고리 끝단에 하얀 소매를 덧 대어 손과 북채를 감추인 채로 북을 두드렸다. 민속 무용에서도 버선발에 긴치마 저고리를 입는 것이 우리네 풍속이었다. 요즈음에는 옛 사람들의 속곳만 입은 듯 한 모양새로 국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흔히 보지만 하여간 한국의 춤이라면 긴 옷자락부터 떠오른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긴 옷자락을 펄럭이는 무복(舞服)은 어디까지나 동북 아시아적 기후와 자연 환경에서 생겨난 현상이었던 것이다.
더운 지역의 악가무일지라도 궁중무용에서는 옷소매와 치마 자락으로 몸을 덮기도 하지만 민속 무용에서는 맨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아름다움이라거나 품위와 점잖음이란 것도 먹고 사는 생존의 토대 위에 형성되는 2차적 가치임을 실감하게 된다. 아무튼 마하사라캄과 로이에 지역 전통 예술단의 공연은 태국의 궁중 악가무에서 민속악과 요즈음의 대중음악에까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었으니 상세한 얘기는 다음호에서 해야겠다.
작곡가·음악인류학 박사 http://cafe.daum.net/ysh3586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제공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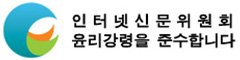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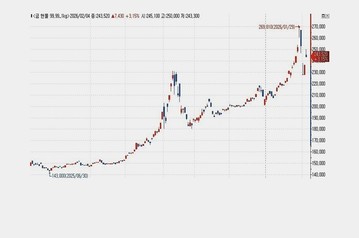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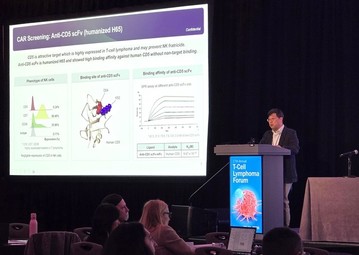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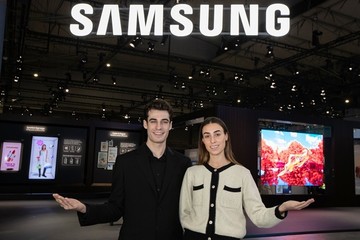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