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까지 차별 받는다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민영화가 이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가 영리병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애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복지부와 의료계, 시민단체의 완강한 거부로 난관에 봉착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재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윤증현 전 재정부 장관은 재임 당시 영리병원 도입의 군불을 땠다. 하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 전 장관에 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박 장관은 사그라진 영리병원 불씨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꾸는 것ㅣ다.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수익 창출 및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재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알수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의료비 수담이 치솟고, 환자의 지갑 사정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료서비스가 달라질 것은 뻔한 이치다.
2008년 마이클 무어 감독은 영화 '식코'를 통해 영리법인이 보편화된 미국 의료체계의 불편한 진실을 고발해 전세계적 이슈를 만들었다. 2009년 우리나라를 방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셀 오바마 영부인은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가 의료민영화보다 낫다는 반증이다.
국민 대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의료민영화를 이룬다면 그 이익은 건강보험에 불만이 많은 부자와 낮은 의료수가에 불만인 일부 의사, 투자회사와 민간보험회사가 고작일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제도(건강보험)는 미국식보다 장점이 많다"며 영리병원을 밀어붙이려는 재정부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던 게 2009년 12월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아픈 데 차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영리병원이 위험한 불장난일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익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온고지신'이라 했다. '옛것을 잘 지켜 오늘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하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와 의료빈부차를 양산할 것이 뻔한 의료민영화 중 어느 것이 우리가 지키고 받들어 오늘에 새롭게 해야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배정전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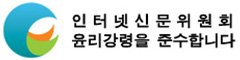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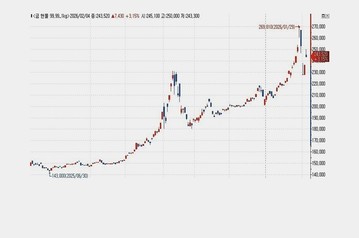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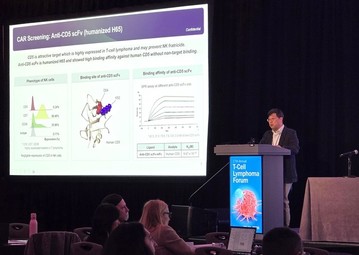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