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하는 것일까.
지난 4일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10일 정모(19) 일병이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안과 부검 결과, 정 일병 왼쪽 가슴에 구타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세 곳이나 발견됐다.
정 일병의 자살에 앞서 지난 9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군을 상대로 구타-가혹행위-집단따돌림 같은 군의 악습에 대한 실태 조사를 긴급지시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긴급지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육군은 2005년 이미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다. 일명 '김 일병 사건'으로 유명한 경기도 연천 최전방 경계소초(GP) 내무반 총기난사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 후 육군은 병사들의 개인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자율 내무생활'을 도입해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또 2009년에는 군내 부적응 사병들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2010년부터는 군내 언어폭력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해병대는 "10년 이상 타군에 비해 병영문화가 뒤져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말처럼 구타 가혹행위 폭언폭설 집단따돌림 등 군의 악습이 여전하다. 2009년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해병대 2개 사단에서 구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막 천공, 늑골 골절, 정강이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은 병사가 943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해 병사들에게 처해진 처벌이라고는 고작 휴가제한 5일에 불과해 해병이 전우를 향한 폭력에 무감각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귀신잡는 해병'에서 '전우잡는 해병'이라는 비아냥을 극복하기 위해 해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언론의 자유'다.
육군은 2005년 '김 일병 총기난사 사건' 후 병사들이 일선 중대장은 물론 사단장.연대장에게까지 병영 문제의 문제점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병은 늦었지만 군 내 악-폐습을 고발할 창구를 만들고 '군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습을 자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만 '전우잡는 해병'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빨간 명찰'의 자부심을 다시금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배정전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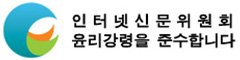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