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스포츠를 두고 '각본 없는 드라마'라 일컫는다. 이 각본 없는 드라마 중에서도 최고 걸작,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명승부가 스크린으로 옮겨졌다.
12일 서울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시사회를 열고 '플레이'를 선언한 스포츠 드라마 '퍼펙트 게임'(감독 박희곤)이다.
한국 야구의 양대 전설 무쇠팔 최동원(1958~2011)과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48)이 1987년 5월16일 각각 롯데 자이언츠와 해태 타이거즈의 투수로 나서 연장까지 15회, 장장 4시간56분 동안 펼친 건곤일척 승부를 담았다.
최동원과 선동열의 맞대결은 당시 사람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두 거물 투수에게는 경상도 대 전라도의 지역감정, 연세대 대 고려대의 학연, 롯데 대 해태라는 제과업계의 라이벌 등 갈라놓는 벽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런 주변 요소들은 각기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지역 사람들이나 팬들의 몫으로 남겨뒀다.
'선동열'(양동근)은 진정한 한국 최고의 투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최동원'(조승우)을 넘어서야 하는 후배, 최동원은 그런 선동열이었기에 결코 등을 보일 수 없었던 선배로 그렸을 뿐이다. 당연했다. 그들은 이미 그 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1981년 대륙간컵,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에서 우승을 합작한 겨레였기 때문이다.
남들이 그들의 대결이 가진 의미를 어찌 해석하든, 두 사람은 오직 상대가 너무 잘하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숙명의 라이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1대 1, 장군 멍군으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러나 소속 구단들은 자신들의 최강병기를 최대한 아끼려고 했다. 그래서 좀처럼 둘의 세 번째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스포츠를 이용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려던 5공 독재정권으로서는 두 선수의 경기만한 호재가 없었다. 결국 그 분의 뜻에 따라서인지, 더 이상 승부를 피하고 싶지 않았던 최동원과 선동열의 의지 때문이었던지 마침내 세 번째 맞대결이 성사됐다.
경기는 롯데가 초반 먼저 1점을 빼앗으면서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후 양팀은 쉽사리 점수를 올리지 못했다. 한국 최고의 투수들이 뿌리는 폭풍투 앞에서 타자들은 잇따라 3자 범퇴를 당했고 0의 행렬이 계속 이어졌다. 그 사이 양팀 감독들은 타자들에게 안타를 치지 못할 바에는 파울이라도 쳐서 상대편 투수를 지치게 하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9회 말이 왔다. 이대로면 최동원과 롯데의 승리로 끝날 상황. 패색이 짙던 해태의 타자는 만년후보였다가 교체 포수로 나선 '박만수'(마동석)였다. 수년동안 숨죽인 채 방망이를 갈고 닦아온 박만수는 한풀이라도 하듯 최동원의 직구를 골라 힘차게 쳐냈고, 이 한 방은 솔로 홈런이 돼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영화가 단지 두 사람의 대결에만 그쳤다면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는 관객들로서는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는 사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진짜 영화는 박만수의 홈런에서부터 시작됐다.
9회 말 해태의 공격이 끝나고 15회까지 연장전이 펼쳐지게 됐다. 휴식 시간 최동원은 어깨를 파고 드는 통증을 물파스로 간신히 막아냈고, 선동열은 사정없이 갈라진 손가락 끝을 접착제를 이용해 겨우 붙였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시작한 대결을 이기든 지든 스스로 마무리짓고 싶어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양팀 선수들은 오로지 최동원, 선동열을 위해 치고, 받고, 달리고, 던질 것을 다짐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고 또 던진 두 선수의 투혼 바이러스가 소속팀 모든 선수들을 감염시켰다. 이를 악물고 그라운드에 선 양팀 선수들은 몸을 던지며 그림 같은 수비를 펼쳤다. 두 사람의 승부가 한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이런 모습들은 관객들에게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어쩌면 이 영화는 바로 이를 위해 지난 100분 이상을 끌어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영화는 두 선수의 실제 경기를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다.
최동원에게 '일구일생, 일구일사'라는 유언을 남긴 경남고 시절 은사 '강 감독'(최일화)과 최동원의 가슴 찡한 사연, 선동열과 같은 구단이지만 입단 이래 한 번도 경기를 뛰어보지 못한 아버지에게 선동열의 사인을 부탁하는 어린 아들을 가진 '박만수'(마동철)의 이야기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또 롯데 '김용철'(조진웅)과 해태 '김일권'(최민철)이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웃음을 준다. 특히, 두 사람의 화장실 공방전은 긴장감으로 꽉 찬 영화에서 감정의 물꼬를 제대로 터준다.
조승우(31)와 양동근(32)은 각기 냉철한 '최동원'과 열정적인 '선동열'을 맡아 마운드의 승부 못잖은 불꽃 튀는 연기 경쟁을 펼치며 싱크로율 100%에 도전한다.
우직하고 의리 있는 이미지의 마동석(40)은 만년 후보의 설움과 아내와 어린 아들을 향한 가족애를 절절하게 표현했고, SBS TV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의 호위무사 '무휼'을 맡아 절제된 연기를 펼치는 조진웅(35)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입만 열면 육두문자인 다혈질적이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맛깔나게 소화해냈다.
긴장감 넘치고 역동적인 경기 장면을 선보이기 위해 배우들은 CG와 편집의 지원 외에도 스스로 실감나는 경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장장 2개월에 걸친 트레이닝 동안 하루 수천개의 공을 최동원과 선동열처럼 던지며 조승우와 양동근은 마운드 위에서만큼은 그들을 완벽하게 닮아버렸다.
조연과 단역 배우들 역시 고난도 슬라이딩이나 수비 장면들을 촬영하다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다. 특히, 조진웅은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에서도 촬영에 임해 영화 속 선수들의 투혼을 촬영 현장의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전파시켰다.
제작진 역시 첨단 장비로 배우들의 열연을 뒷받침했다.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트러스트 카메라를 동원해 시속 150㎞에 달하는 투구를 생생하게 담았고, 슬라이더 카메라로 포수의 미트 속에 빨려드는 야구공을 포착했다. 초고속 팬텀 카메라로는 구질까지 고스란히 옮겼다.
30년 전 리틀 야구단원으로 활동한 어린 시절 자신의 우상이었던 최동원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겠다는 꿈을 각본과 연출을 맡아 마침내 실현한 박희곤(42) 감독은 "야구장이라는 검투장에 두 선수를 가둬두고 창과 방패를 던져줬다. 두 선수는 꿈을 걸고 인생을 걸었고, 전설이 됐다"고 회고한 뒤 "한 분(최동원)한테는 헌정을 하게 됐고 한 분(선동열)한테는 응원을 하게 됐다. 그 분들도 결국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관객들도 이 영화를 보고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야구 호불호를 떠나 실제 인물인 두 선수에 대한 애증과 상관없이 단지 영화 뿐이었다면 절대 믿을 수 없을 스토리가 실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볼만한 영화다.
영화에서 강 감독은 최동원에게 "투수는 어깨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퍼펙트 게임'을 보면서 눈으로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승리하고자 했던 선수들의 정신, 노력, 땀의 가치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면, 더불어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영화 관람료만큼은 만족스럽지 않을까.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제공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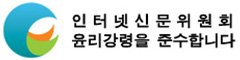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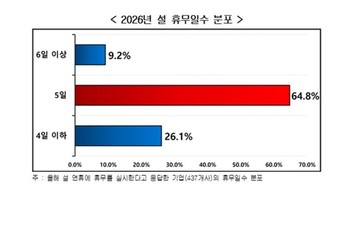





















![[포토] 가평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주조종사와 부조종사 사망](/news/data/20260210/p1065543471836542_109_h2.jpg)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