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동차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P씨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다. 이 대기업은 현재 100여개의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P씨는 이 공장 소속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연봉은 이들의 절반에 불과하다.
종합병원에서 엘리베이터 등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A씨는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이 병원은 최근 원무과 직원을 비롯해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을 용역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크게 차이난다. 하지만 통계는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만5000명이다. 공식 통계상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규모를 놓고 통계청과 노동계 추산이 달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9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3월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1706만5000명)의 48.7%인 831만2000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추산했다. 통계청 발표와는 230만명 정도 차이난다.
이 같은 통계상 차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통계청은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전일제로 일하는 학원강사, 식당 종업원 등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사내 하도급 직원이나 자영업체 종업원들은 '비정규직 질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만든 기준을 비정규직 규모 산출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바뀐 노동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 간 사내 하도급을 비롯해 근로여건이 정규직이 미치지 못하는 직종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호 민주노총 비정규직 실장은 "경제활동 부가조사의 경우 조사원들이 낮 시간대 가구를 직접 돌며 설문을 벌이는데, 주로 남편이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면서 "남편의 직업이 직접고용인지 간접고용인지, 일용인지 상용인지를 구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국세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노동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의 비정규직 규모 산출 기준은 노사정이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면서 "통계 개편을 하려면 또 다시 노사정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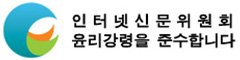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