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현실을 직시하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매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현행 주민직선제인 교육감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공동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물론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야당과 일부 시민 교육단체들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도를 정치논리로 폐지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민간 선출방식으로 바꾼 것은 지난 1991년부터다. 당시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추천으로 뽑다 금품수수 및 추문이 끊이지 않자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로 선출권한을 넘겼다. 하지만 이번에 학교운영위원 위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2006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지역 교육감을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간 네가티브와 고소와 고발, 그리고 각종 추문들이 난무하면서 얼룩졌다.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10~20개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돌며 얼굴을 알려야 했다. 때문에 유권자들 상당수는 후보자들의 얼굴조차 모른채 투표에 임했으며 그 결과 당선자 실질득표율은 10~20%에 그쳤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30~40억원에 이르는 법정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15% 득표를 못하면 그 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한다.
작년 선거에 출마한 74명의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916억으로 이중 576억원만 국고로 보전받았다. 한 사람당 4억6000만원의 자기 돈을 쓴 꼴이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의 금품 스캔들은 이런 제도적 허점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또한 정치중립의 명분 속에 등장한 교육감 주민직전제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났듯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구도로 변질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당시 이념 색깔이 다른 자치단체장과의 잦은 이념논쟁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킨점을 상기해야 한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직선제 폐지가 우세한 것 역시 이같은 제도적 허점과 이념논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유권자들이 지쳐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는 형식의 섣부른 제도 개혁보다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을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대웅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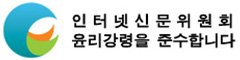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