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월23일 오전 서해 연평도에 북한의 해안포 30여발이 날아들었다. 상당수는 해상에 떨어졌지만 일부는 군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졌고, 연평도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다.
군은 '아서(ARTHUR)'급 대포병레이더와 음향표적탐지 장비인 '할로(HALO)'를 이용해 북한의 해안포가 발사된 도발원점을 포착했다. 즉각 K-9 자주포와 130㎜ 다연장로켓 '구룡'을 이용해 수십발의 대응사격에 돌입했다.
10여분 뒤 내륙기지에서 출격한 F-15K 편대가 서해상에 도착해 합동직격탄(JDAM·사거리 28㎞)과 레이저 유도폭탄(GBU-31·GBU-38)으로 북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정밀 타격했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의 기습침투가 예상된다는 첩보에 따라 육군 UH60 헬기로 해병대원들이 연평도에 증파됐다.
#2. 11월23일 새벽 어둠이 깔린 서해상 NLL 남쪽에서 북한의 공기부양정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야간 탐지작전을 펼치던 해군 초계함 레이더에 포착됐다.
올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창설과 함께 백령도에 새롭게 배치된 AH-1S 코브라 헬기가 즉각 출동해 연평도 해안에 도착했고, 고속으로 접근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집중 타격했다.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로 추가 도발할 것에 대비해 K-9 자주포와 새로 배치된 자주벌컨, 130㎜ 다연장로켓도 일제히 북한의 포격 원점을 정조준했다.
1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그 동안 군의 증강된 전력과 대응 시나리오를 토대로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가정했다.
군 대응태세 변화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진 점은 서북도서에 대한 작전지침 변경과 작전 영역이 크게 확장된 점을 꼽을 수 있다.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방사 창설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작전을 주도적으로 펼치도록 작전태세를 완비했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해안포 등 화력을 동원해 도발하거나 공기부양정으로 서북도서를 기습 침투할 때를 대비해 서방사를 주축으로 육·해·공군 합동화력을 지원토록 했다.
또 서북도서 및 NLL 일대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작전의 주체가 합동화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작전체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서해 북방 5도 공격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공동 대응 작전계획이 올해 말 완성된다. 한미는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 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의 국지 도발 시 초기단계에서는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독 대응하되 한·미가 공동으로 추가도발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전 효율성 논란은 여전하다. 8월 연평도 포격 이후 전투기에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는 권한이 지난 3월 합참의장에서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이관됐지만 발사명령은 여전히 합참의장이 보유하고 있어 계속해서 강조해온 '선(先)조치' 개념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아직도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및 상륙작전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군내 이견과 갈등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최근엔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 등에 탑재될 상륙 기동헬기 40대의 운용권을 놓고 해군과 해병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해 전력증강도 이뤄지고 있고 육해공군 합동 전력을 활용한 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몇 배로 응징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제공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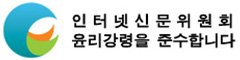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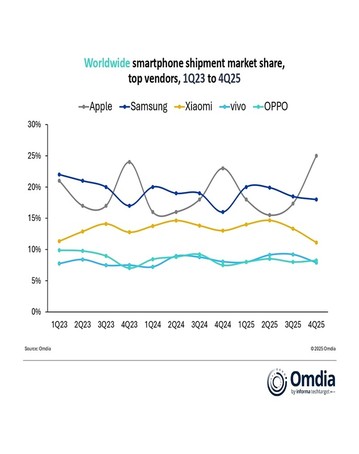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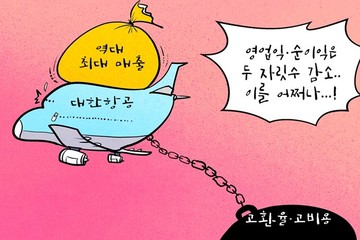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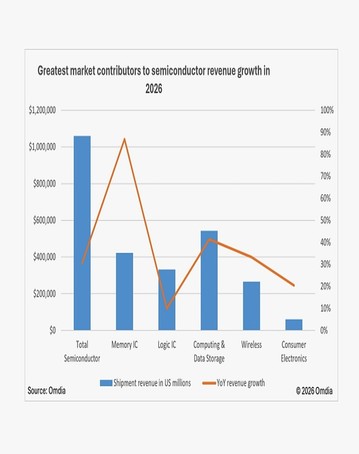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포토] 제야의 종이 울리며 '붉은 말의 해' 시작](/news/data/20260101/p1065545470543576_5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