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안 법률안' 등 모두 16건의 의안이 처리된다. 아직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 절차를 마치지 않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의 관건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Investor-State-Dispute)를 둘러싼 공방전이 거세다. 여당은 "필요조항이다", 야당은 "독소조항이다"라며 맞서고 있다. ISD,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살펴봤다.
# ISD는 어떤 제도인가?
원칙적으로 ISD는 강자(국가)로부터 약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기업은 해당 국가 법원보다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 국가로부터 부여 받는 게 핵심이다. 취지로 보자면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있듯, 우리 기업 역시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제도가 ISD다.
# 한·미 FTA에서의 ISD는 위험하다?
ISD는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40년간 우리가 맺은 81개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은 물론 최근 수 년간 발효된 6개의 FTA에서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외국기업이 우리 정부를,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때문에 한·미 FTA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난히 제소를 즐기는 미국 기업들의 '호전성'과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 비준안에서 지나치게 넓은 부분은 문제다. 지금까지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기된 ISD 관련 제소 390건 가운데 미국기업이 제시한 제소는 4분의 1 이상인 108건이다.
여기에 기존 양자간투자협정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해 들어온 외국 회사가 설립 이후 투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어 적용 범위가 좁았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국내 진출 전 투자환경에 대한 소송까지 가능한 점 등 그 적용범위가 넓어 미국 기업의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 소송하면 미국만 유리하다?
ISD를 비판하는 측은 국제상사분쟁재판소까지 갈 경우 국제적 영향력이 큰 미국 측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미국이 유리할까?
국제상사재판소의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된다. 소송 양 당사자가 각각 1명씩 임명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상사재판소 사무총장이 선정한다. 야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2대1의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미국 기업이 제기한 108건의 ISD 제소 중 최종판결이 난 55건 가운데 미국의 승소율은 14%(15건)로 패소율(20%로 22건)보다 낮다. 세계은행이 미국만을 편든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다만 '일부 승소'를 포함할 경우 승소율이 60%까지 높아진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통상 일부 승소는 제소 내용의 절반 정도를 들어주는게 관례여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ISD 제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대웅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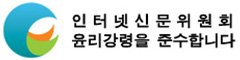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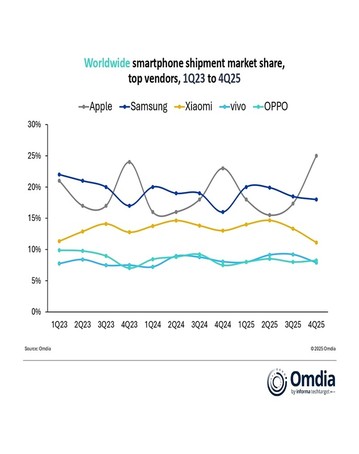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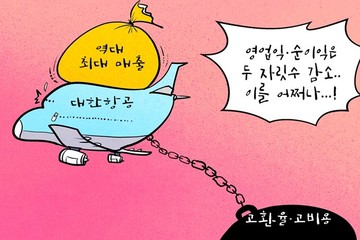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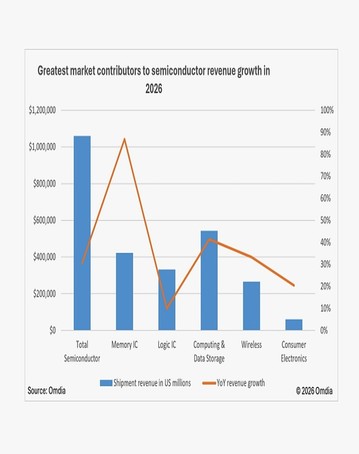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포토] 제야의 종이 울리며 '붉은 말의 해' 시작](/news/data/20260101/p1065545470543576_5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