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물 날 줄만 알았다. 너무나 힘들었고 고생을 많이 한 작품이다. 하지만 마지막 ‘컷’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행복했다.”
영화 ‘블라인드’는 김하늘(33)에게 도전 같은 작품이다. 로맨틱 코미디, 청순가련, 도도 등 다양한 캐릭터를 구축해왔지만 시각장애인 ‘수아’ 역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영화 뚜껑을 열어보니 김하늘은 ‘민수아’와 하나가 돼있었다. 다치고 멍들고를 반복하며 시각장애인이 지닌 극한의 외로움도 느꼈다.
“내가 과연 잘 표현할 수 있을까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관객들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촬영 내내 안아주고 싶었던 ‘수아’라는 친구를 잘 표현하고 싶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지닌 분들에게 애정을 갖고 사랑을 하면서 연기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촬영장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스스로에게 예민해졌다. 한 컷 한 컷을 신경 쓰면서 촬영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대했다. 기존 촬영장에서 장난도 잘치고 농담도 잘하는 편인데 ‘블라인드’하는 동안에는 예민해서 화난 사람처럼 곤두 서있었다”는 고백이다.
영화 속 김하늘은 경찰대 재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동생도, 시력도 잃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빠져 살면서도 온 몸으로 느낀 뺑소니 사고 첫 번째 목격자로 당당히 나서는 용기 있는 인물이다.
실제 김하늘이라면 ‘민수아’처럼 범죄 현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아’가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중도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3년이 고비라고 하더라. 그 3년 동안 1년은 집에서 안 나오는 분들도 많고…. 나도 그럴 것 같다. 나중에는 ‘수아’처럼 용기를 내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현장 범인을 잡기 위해 뛰어들기는 힘들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촬영 전 눈을 가리고 걷는 장면을 연습했다. 한 발짝 걷는 것도 겁이 났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옆에 선생님과 스태프들이 있었는데도 무서웠다. 실제 시각장애인들도 뛰지 않는다. 집에서 역까지 보폭들을 계산하고 체크한다. 그런 분들이 뛴다고 느끼기가 힘들었다.”
고된 촬영, 힘든 감정연기 등으로 김하늘은 보이지 않는 ‘수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수아’에게서 느껴지는 고독함, 극한의 외로움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다.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 안에서 굉장히 머물러 있는 편이다. 하지만 ‘블라인드’는 현장과 현장 밖의 모습을 다르게 하고 싶었다. 현장에서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밝게 행동하고 드라이브를 가든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분을 전환시켰다”고 전했다.
“촬영이 너무나 답답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마지막 ‘컷’ 사인에 진짜 행복했다. 다른 작품들은 시원섭섭함에 울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그저 벗어난 기분이었다. 고생을 많이 해서 나도, 스태프들도 다 울 줄 알았다. 하지만 눈물이 안 났다”며 흡족해했다.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제공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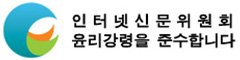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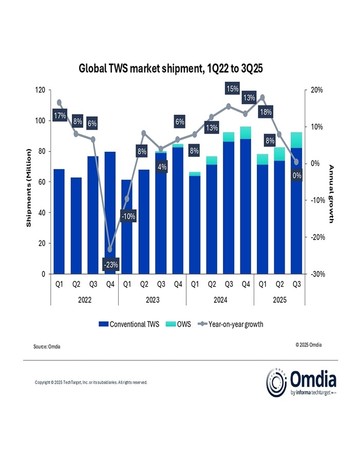











![[포토] 수도권 최고 8cm의 '첫눈'…평년보다 2주 늦어](/news/data/20251205/p1065543804081158_264_h2.jpg)
![[포토]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특별전 개최](/news/data/20251201/p1065540343319242_584_h2.jpg)
![[포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news/data/20251127/p1065553978151936_45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