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좌)와 중국 부총리 왕치산(우)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완벽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지난 5일(현지시각) 뜻밖에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됐다. 중국 등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한 국채는 투자 매력이 사라져 값이 떨어지기(국채금리 상승) 때문이다. 신용 평가사 S&P가 1941년 신용등급 평가를 시작한 이래 70년간 미국의 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미 국채에 투자한 나라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전체 물량 가운데 13%를 보유한 최대 투자국이어서 충격이 가장 컸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중국
토요일(6일)에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아직까지 중국 당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5월 말 현재 3조447억달러의 외환보유액 중 1조1600억달러(38%)를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 국채 가치가 20~30% 정도 떨어질 거라는 시장 분석을 적용하면 중국은 가만 앉아서 2300억~3400억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13억 중국인들이 일인당 20만~30만원(180~260달러)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침묵한 중국 정부와 달리 중국 언론과 경제연구소들은 분주하게 소식을 전하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6일 "미국이 빚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상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루레이런 광둥금융대학장은 "미국이 부채 한도를 높여 위기를 피했지만 미국 경제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채권자'로서의 우위를 확실히 점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땅한 대안 없어 팔지도 못해
단기적으로 미 국채를 대신할 만한 안전자산이 없기 때문에 미 국채를 내다 팔기도 어렵다. 세계 채권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AAA 등급의 국채들 중 미 국채 비중은 60%에 달한다. 2위인 프랑스 국채 비중(11%)은 미 국채의 6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미 국채 외 마땅히 투자할 안전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오히려 미 국채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는 '외국인들이 미 국채를 공격적으로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미 국채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다음으로 미 국채에 많이 투자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외신 인터뷰에서 "미 국채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고 안전자산으로서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보유액과 관련된 일본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역시 7일 "미 국채에 대한 신뢰엔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 3110억달러 중에 미 국채를 325억달러어치 보유하고 있고, 미 국채를 포함한 달러 표시 자산을 64% 갖고 있다.
◆중장기적 미국채 값 떨어질 가능성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미 국채가격이 떨어질(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S&P는 5일 "한 번 AAA 등급을 잃으면 일반적으로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캐나다와 호주가 AAA등급에서 탈랐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데 각각 8년, 16년씩 걸렸다. 신영증권은 "미국 국가 부채가 월 평균 1000억달러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미국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지만 시간만 벌었을 뿐 다시 파산 우려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중국과 중동의 국가들은 종전보다 미 국채를 덜 사들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1999년 72%였는데 지난 3월 현재 60.7%로 줄었다"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채를 대체할 안전자산으로 금과 독일 국채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배정전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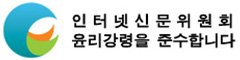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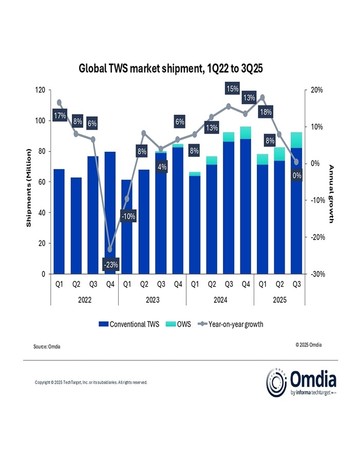











![[포토] 수도권 최고 8cm의 '첫눈'…평년보다 2주 늦어](/news/data/20251205/p1065543804081158_264_h2.jpg)
![[포토]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사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특별전 개최](/news/data/20251201/p1065540343319242_584_h2.jpg)
![[포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news/data/20251127/p1065553978151936_45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