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본질이 잡힌 것인가. 또 다른 투기판의 서막일 뿐인가.
 |
하지만 묻고 싶다. 집값의 본질이 잡힌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투기판의 서막일 뿐인가.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속내는 여전하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이를 당연한 훈장처럼 여기는 기성세대의 탐욕이, 또다시 ‘부동산 공화국’의 무게로 미래세대를 짓누르고 있다.
어느 젊은이의 푸념이 귓가를 때린다. “집 한 채 사기 위해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셋값, 매매가에 절망하며 알바와 비정규직의 삶에 허덕이는 청춘에게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꿈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도 결혼도, 가정도, 내 집도 꾸리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삶의 의욕마저 잃어간다.
우리는 언제부터 집을 사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나. 왜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청춘의 전부를 담보 잡혀야 하는가. 기성세대는 말한다. "우리도 그렇게 고생해서 집 샀다"고.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것도,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도 그들이다. 그들의 투기는 세대를 넘겨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빚’이라는 형벌로 돌아왔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된 사회에서 '주거'는 사라졌다.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수익자산이 됐다. 강남, 목동, 마포, 용산,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욕망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재편되고 있다. 대출을 막으면 서민과 중산층이 집을 사는 길이 더 멀어진다는 비판에도 정부는 대출 총량 조절의 칼날을 들이댄다. 정부의 손에 금융이 휘둘리는데, 미래 세대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맛보기일 뿐"이라 했다. 더 강력한 규제도 예고했다. 하지만 규제가 투기꾼의 돈줄을 끊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서민과 청년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옥죄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성세대의 투기적 삶의 방식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다주택자들은 법망의 허점 사이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서울의 집값은 '숨 고르기'일 뿐 결코 멈추지 않았다. “서울 시민의 소득은 오르니까, 더 좋은 집을 사려는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단골 해석이 여전하다. 그렇다면 그 좋은 집의 가격은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오늘의 청년에게 강남, 목동은커녕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기성세대가 집을 사고, 값이 오르면 팔아 이익을 취하는 동안, 청년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내집 마련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흙수저 청년들에게 집이란 평생을 빚으로 채우는 감옥에 다름 아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깨지 않고 어떤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고, 심지어 인간다운 삶마저 포기한다. 집이 없다는 이유로.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사야만 하는 집.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탐욕으로 만든 이 집값의 덫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좀먹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다. 인간답게 머무는 삶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가족의 행복을 가꿀 둥지다. 정부의 대책이 진정 그 지점에 닿아야 한다. 대출 규제 하나로 집값을 잡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절망의 울음이 도시 곳곳에 번지고 있다. 알바천국에서 하루를 보내고, 원룸 반지하에서 삶의 끝자락을 버티는 청년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대로라면 21세기는 부동산 노예의 시대다. 집 한 채가 평생의 무게가 되고, 가난의 대물림이 되는 이 지독한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집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성세대와 위정자들은 이제라도 반성하고, 이 땅의 청춘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집값에 짓눌린 삶’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의 청춘이, 꿈이, 그리고 미래가 더 이상 집값에 인질로 잡히지 않기를...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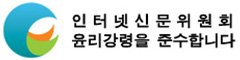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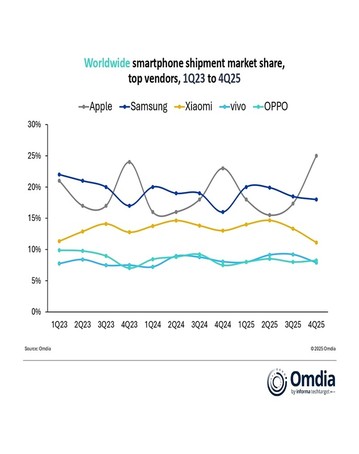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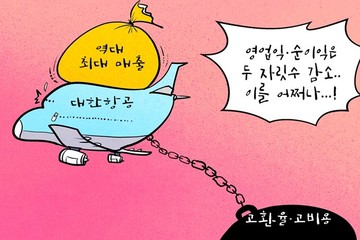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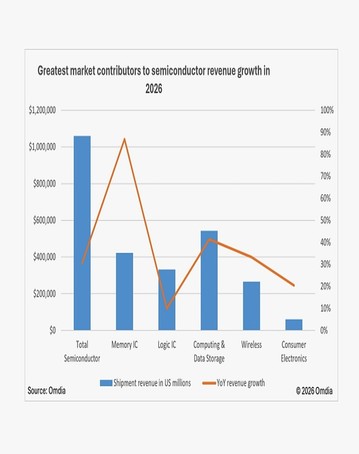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포토] 제야의 종이 울리며 '붉은 말의 해' 시작](/news/data/20260101/p1065545470543576_5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