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카카오 로고 [제공/카카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2017년 63개, 2018년 72개, 2019년 71개, 2020년 97개에서 올해 118개로 늘었다.
카카오는 총 71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 총액 순위로는 18위에 그쳤지만, 계열사 수로는 SK(148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사례를 살펴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을 합치는 '혼합결합'이 상당수인데, 수평·수직결합과 달리 경쟁 제한성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심사 통과가 한결 쉬운 편이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 '딜카' 인수를 혼합 결합으로 보고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플랫폼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심사 대상에서 아예 빠지거나 심사를 받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연말부터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제한성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해 전반적인 제도 보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산·매출 등 회사 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용자가 많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때는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기업규모뿐 아니라 거래금액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
| ▲ 네이버 로고 [제공/네이버] |
앞으로는 콘텐츠·SNS 등의 월간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천억원 넘게 주고 인수할 경우에도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성급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 성장을 막는 일은 경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섣부르게 기준을 강화해서 결합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해외 경쟁 당국의 사례를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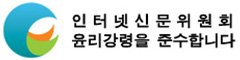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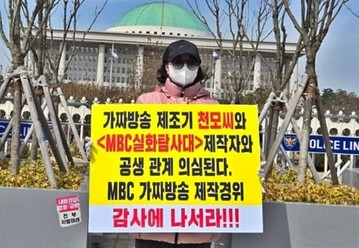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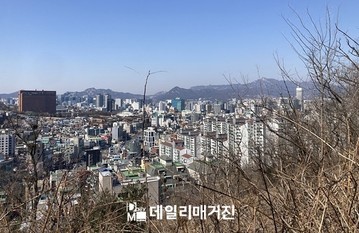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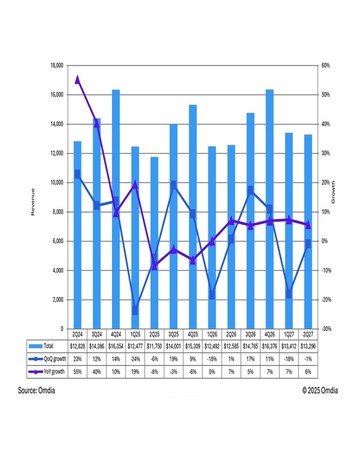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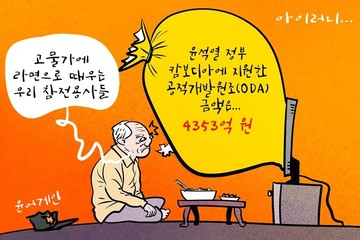








![[포토]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쌀쌀해진 날씨에 두꺼워지는 옷차림](/news/data/20251021/p1065539953453247_118_h2.jpg)
![[포토] 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가을 감성 가득한 '수원 황구지천'](/news/data/20251010/p1065540513889794_778_h2.jpg)
![[포토] 추석을 하루 앞둔 5일…차례상 준비에 붐비는 전통시장](/news/data/20251006/p1065539268833600_59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