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 남영진 논설고문] 지난달 고려대 73학번 동기들과 찾은 화천의 비수구미 계곡은 파로호, 평화의 댐 지역에서도 맑고 깨끗한 계곡으로 유명하다. 계곡인지 선경인지 구분이 안 된다.
행정지명으로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비수구미길. 고개에서 파로호까지 걷기에 최고다.
자연원시림과 넓은 바위가 계곡을 따라 밀집되어 있고 계곡 끝이 파로호여서 가족 단위로 낚시와 피서를 겸해 찾는다. 이 파로호 북측에 평화의 댐을 막았는데 바닥에 우리 구석기유물이 잠겨있다.
5공의 전두환대통령 시절 북한의 수공(水攻)을 막는다고 국민의 성금을 모아 ‘평화의 댐’ 공사를 시작하자 파로호에 잠긴 구석기 유적이 드러났다.
1986년 12월부터 파로호 상류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바로 밑에 있는 파로호의 물을 빼려 화천댐 수문을 열자 파로호 바닥에 있던 선사·유사시대의 각종 유적과 유물들이 드러났다.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국민을 동원해 체제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엄청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부수효과’를 얻은 것이다.
당시 강원도 박물관을 비롯한 고고학계는 흥분해 3년여 간 집중 발굴했다. 그러나 각종 유적들은 화천댐 수문을 닫은 1989년 여름부터 다시 수몰됐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다시 물속에 잠겨 훼손되고 있을 것이다.
봄철과 같은 갈수기에 파로호의 물이 줄어 수면이 낮아지는 시기에 발굴조사를 계속해 파로호 유적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사진=양구 선사박물관 안내 표지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해 화천 수력발전소 댐을 1942∼1944년에 만들면서 인공호수가 생겼다. 한국전쟁 말기에 이승만대통령이 중공군을 수장시켰다해서 ‘파로(깰 파, 오랑캐로)호’로 명명했다.
댐 건설 당시 화천·양구지역 3개면 20여 개 마을이 수몰됐지만 전쟁 중인 일제가 유적, 유물에 관심을 가질리 없었다.
평화의 댐을 만들면서 40여년 만에 호수의 물을 빼내자 수몰지역 3분의 2의 바닥이 노출됐다. 1942년까지 그 곳에 살던 생활흔적이 나타나 강원대 박물관이 1987년부터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게 됐다.
결과, 양구읍 상무룡리(上舞龍里)에서는 구석기시대 유적이 나왔다. 이 구석기 유적은 우리 나라 구석기문화를 대표하는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유적과 함께 구석기문화의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어 북쪽의 양구군 서천(西川)과 수입천(水入川) 10㎞의 강가에서 구석기 유적 15곳이 더 발견됐다.
상무룡리 구석기 유적에서는 까만 흑요석(黑耀石)의 석기 250여 점을 포함해 8,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돼 고고학계가 떠들썩했다.
타 유적 석기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후기 구석기시대인 2∼5만년 전에서, 7∼12만 년 전의 중기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됐다.
유물은 주먹도끼 찍개 찌르개 사냥돌 긁개 밀개 자르개 째개 주먹까뀌 주먹대패 주먹괭이 새기개 뚜르개 톱날 돌망치 등 다양했다.
재밌는 것은 석기에 왼손잡이용이 있었다. 긁개의 9.8%, 밀개의 8.8%가 왼손잡이용이었다. 구석기인들 중에도 왼손잡이가 8∼10%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지역 회양과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북한강이 양구의 서천과 합류하는 일대인 서호(西湖) 모일(暮日) 산곡(山谷) 동촌(東村) 반구뫼 신내 병풍골 등에서도 구석기들이 나왔다.
이로써 파로호 수몰지역이 구석기시대 유적의 보고임이 밝혀졌다.

▲사진=양구읍 고대리 하리 공수리 지역에서는 많은 청동기시대 고인돌(dolmen) 유적
양구읍 고대리 하리 공수리 지역에서는 많은 청동기시대 고인돌(dolmen) 유적까지 있었다.
고인돌은 고대리서 5기, 하리에서 고대리로 이어지는 3㎞의 강기슭에 18기, 고대리의 새말 서천 옆 모래톱에 8기, 주막거리에 11기, 공수리에 2기 등 40여 기가 있었다. 1942년 이전에 양구읍 앞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고대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꺾여 화천읍으로 흘러 내려가는 지역이다.
이 고인돌의 무게는 약 21t으로 200명의 장정이 힘을 합해야 움직일 수 있는 중량이다. 그렇다면 청동기시대 양구 일대의 인구는 적어도 800∼1,000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 인구는 청동기시대의 성읍국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였다.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황해도 은율, 경기도 강화, 전북의 부안, 전남의 화순 등 전국에 산재한 고인돌이 전 세계의 3분의2를 차지한다는 것만 봐도 ‘고인돌의 나라’였음이 분명하다.
상무룡리 구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의 재료는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석영을 많이 사용했으며 다른 지방에서 가나는 흑요석, 판암 같은 돌은 비교적 적었다. 석기제작용 공구들과 제작과정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덜 된 석기, 몸돌 등이 대량으로 출토됐다. 그들이 이곳서 오랜 동안 석기를 만들어 생활했음을 증명한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선사인(先史人)들이 석기를 만들 때 쓰던 귀중한 석재다.

▲사진=양구 장생길 안내 표지
휴대용으로 이동하면서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문화전파와 교류는 물론 인류의 이동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다. 구석기시대 흑요석 석기는 함경남도 웅기 굴포리,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 충청북도 단양 수양개, 경기도 양평 교평리, 연천 전곡리와 신답리에서 발견됐다. 신석기시대의 흑요석은 함경북도 회령, 경상남도 통영 상노대도(上老大島), 부산 동삼동, 강원도 양양 오산리 등지에서도 출토된바 있다.
상무룡리 유적의 흑요석을 중성자방사화방법(neutron activation analysis)으로 분석한 결과연천 전곡리, 양평 교평리, 야양 오산리의 흑요석과 같은 백두산계로 밝혀졌다. 따라서 상무룡리 흑요석도 백두산에서 양구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 흑요석제 석기의 전파경로를 추적, 연구한다면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사람과 문화의 이동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구석기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석기의 제작수법이나 형태가 연천 전곡리 유적과 비슷하고 중국 시베리아 일본지역의 구석기 유적과도 연관성이 있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한국 구석기문화의 전파과정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적은 가장 늦게 잡아도 중기 구석기시대인 7만∼12만 년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어서 앞으로 좀 더 깊은 지층을 발굴한다면 전기 구석기시대 문화층도 나타날 것이다.
※ 남영진 논설고문은 한국일보 기자와 한국기자협회 회장, 미디어오늘 사장, 방송광고공사 감사를 지내는 등 30년 넘게 신문·방송계에 종사한 중견 언론인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남영진 논설고문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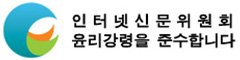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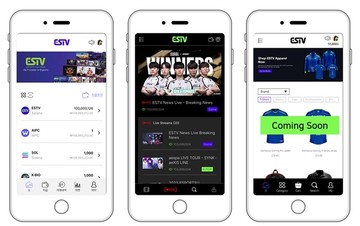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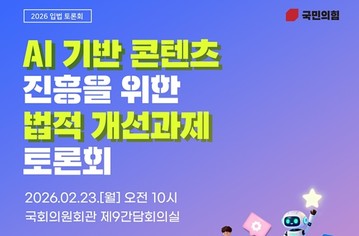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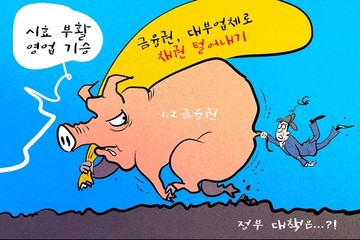











![[포토] 고물가 시대, 명절 장보기…마트와 전통시장, 실속소비가 대세](/news/data/20260217/p1065543763827342_524_h2.jpg)
![[포토] 가평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주조종사와 부조종사 사망](/news/data/20260210/p1065543471836542_109_h2.jpg)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