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 구성에서 전술까지 연속성을 찾아볼 수 없다.
허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은 25일 막을 내린 제26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로 대회를 마쳤다.
7위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뒀던 2009년 톈진대회보다 순위는 올랐지만 런던올림픽 본선 티켓이 목표였기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허 감독은 소속팀 전주 KCC를 내팽개치고 대표팀에만 온 힘을 기울였고 선수들은 시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땀을 흘렸다. 그러나 스포츠는 결과로 말한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대표팀 전임감독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중국, 필리핀처럼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자는 소리도 있다. 허 감독의 전술, 선수기용의 성공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어차피 거론될 이야기들이다.
한국 남자농구는 2008년 전임감독제를 도입해 김남기 전 연세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으나 이듬해 4월 김 전 감독이 돌연 사임을 선언하면서 프로농구 오리온스의 사령탑으로 옮겼고 전임감독제는 흐지부지됐다.
아시아선수권 개막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부랴부랴 2008~2009시즌 우승팀 감독인 허 감독을 사령탑에 앉혔다. 이는 자연스레 문서화도 되지 않은 '그들만의 약속'이 됐다.
전임감독제에서는 감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팀을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안을 찾는데 집중할 수 있다. 전술적인 면에서도 일관성과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고 한국의 강점인 조직력을 키우는데도 유리하다. 감독이 매번 바뀌는 현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번 허 감독과 지난해 광저우아시안게임의 유재학 감독은 스타일에서 큰 차이가 있다. 허 감독이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이승준을 대신해 문태종으로 단 하나뿐인 귀화선수 엔트리를 채웠을 만큼 다르다.
나머지 선수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농구에 적응해야 했다. 잘 될 리 없다. 이란과의 결선리그,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문태종만 찾다가 끝난 경기들이다.
지휘봉을 잡은 감독에게도 대표팀은 부담이다. 허 감독은 귀국하자마자 소속팀 KCC의 한일 챔피언십을 위해 일본 시즈오카로 떠나야 한다.
지난 시즌부터 2011~2012시즌 개막을 앞둔 현재까지 거의 쉬지 못하고 있다. "팀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으니 대표팀만 잘 이끌라"는 구단의 배려가 없었다면 허 감독은 구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할 타입의 감독이다.
좋은 성적 내라고 고액 연봉 챙겨줬더니 다른데 가서 힘쓰고 있는 꼴이 현재 허 감독이다. 유재학 감독은 지난 시즌 도중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감독직을 맡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쳤다.
일부에서 허 감독의 고집스러운 성격이 전술과 선수기용이 중국전 패배를 비롯해 필리핀전에서 고전한 원인이라고 비난한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대표팀 감독 자리를 '독인 든 성배'에 비유하는 이유다.
여자 농구도 마찬가지다. 안산 신한은행이 5년 연속 정상에 오르면서 임달식 감독체제 아래서 연속성을 가졌지만 이 역시 언제 바뀔지 모른다. 구단간 이해관계에 얽혀서 선수 차출을 거부하는 구단까지 있으니 남자보다 더한 부분도 있다.
남녀 농구 모두 내년에 있을 런던올림픽 최종예선에 나가야 한다.
한국 농구는 물론 남녀 16개 프로 구단과 감독들을 위해서도 전임감독제 도입이 시급하다.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제공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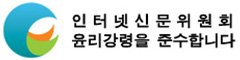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포토] 제야의 종이 울리며 '붉은 말의 해' 시작](/news/data/20260101/p1065545470543576_5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