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서는 여자 국제축구심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스름하게 동이 틀 무렵인 지난 10일 오전 5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대운동장.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정지영(28·여)씨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스트레칭을 마친 정씨는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메고 운동장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정씨의 발걸음 따라 흙먼지가 연신 일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을 그리며 한참을 내달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가량을 달린 정씨의 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 올랐다. 정씨는 가쁜 숨은 몰아쉬면서도 환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정씨는 축구장에서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기를 한다고 했다.
"심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판정입니다. 선수 못지않은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덩달아 집중력도 떨어져 오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운동장에서 선수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심판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선수들이 심판을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정씨는 대학 재학 시절 다년간 현역 축구선수로 활동했다. 팀 동료들과 피땀을 흘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일궈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씨가 계속 축구선수로 활동하기에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선수가 부족해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그나마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도 상상 이상으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결국 선수 활동을 포기하는 게 부지기수라고 한다.
결국 정씨는 남자축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척박한 여자축구 현실에 부딪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선수활동을 접었다.
"여자축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선수의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과 실업팀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으니 결국 선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라운드를 떠난 정씨는 마케팅을 전공해 '스포츠산업 경영학회'에서 근무하며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시작했다.
아쉽고 찝찝한 기분을 남겨둔 채 그라운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씨의 머릿속에는 '축구'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정씨는 선수가 아닌 심판으로 그라운드에 다시 서겠다고 결심하고 험난한 도전에 나섰다.
국제축구 심판은 축구 규칙은 물론이고 영어 회화와 체력 테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씨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꾸준한 체력관리와 영어 공부에 매진한 결과 2007년 1월에 3급 축구심판자격증 취득하고 올해 3월 1급 국제축구심판 자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정씨는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국제심판에 도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다"며 "그럴 때마다 휘슬을 불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후배 현역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토로했다.
"후배 현역 선수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혹 그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선 일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씨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잘못했을 경우 가차없이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내민다고 했다.
경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승패가 뒤바뀌거나 선수들이 다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란다.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거는 기대도 남달랐다.
정씨는 "도전하는 누구에게나 길은 반드시 열린다"며 "축구에서 꿈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에 국내 최초 여성심판으로서 당당하게 한국인의 위상을 떨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라운드를 호령(?)하고 있는 정지영씨. 국내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서는 여성 국제축구심판이라는 꿈을 안고 선수가 아닌 심판으로서 제2의 '축구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뉴시스 제공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시스 제공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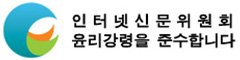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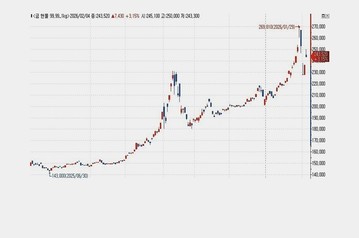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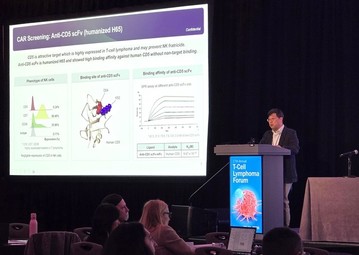












![[포토] 故이해찬 전 총리, 애도 속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news/data/20260201/p1065540042965203_830_h2.jpg)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