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2G·3G'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15일 통신 업계예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G·3G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4G요금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1만1천원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6200만명이다. 이 가운데 2G와 3G가입자는 각각 330만명, 1120만명으로 전체에 23%를 차지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기본료 일괄 폐지는 힘들더라도 2G와 3G 기본료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해당 가입자들에게 1만1천원의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통사의 수익은 약 1조 9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당초 전체 가입자 기본료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 금액 약 7조~8조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또한 운영구조를 보면 2G·3G 가입자를 구분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G의 경우 고정적인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오히려 기본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 가운데 지난 2012년 3월 19일자로 2G 서비스를 종료한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2G망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2G 가입자는 2012년 기준 1080만명이었지만, 현재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울러 3G 역시 음성통화 등에서 4G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는 만큼 단순 요금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다 더해 3G와 4G 데이터 속도가 체감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아,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3G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로인해 3G에 가입자가 몰리면 통신 서비스 발전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시장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공약 세부 이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시장 경쟁을 기본으로, 소비자별로 원하는 통신비 경감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태일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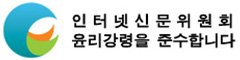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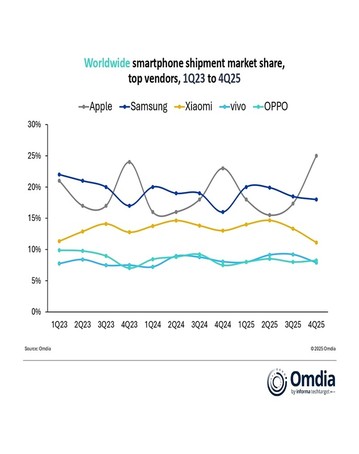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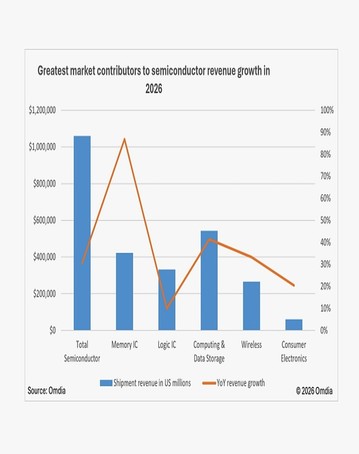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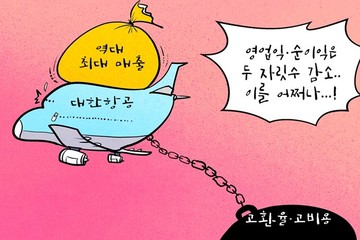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포토] 제야의 종이 울리며 '붉은 말의 해' 시작](/news/data/20260101/p1065545470543576_5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