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총재 사례로 본 나눔의 흔들림, 그리고 법치 만능의 그늘
 |
| ▲사진=허경영 명예 총재가 운영하고 있는 하늘궁무료급식소 |
이런 가운데 여러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매일같이 건넨 “밥은 먹고 가라”는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는 법정의 피고석 앞에 서 있다. 이 장면은 한 종교 지도자의 사법 절차를 넘어, 오늘날 종교인들이 맞닥뜨린 ‘수난의 시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허 총재의 사기 등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따라 절차 방해 우려 시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
재판부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첫 절차를 비공개로 연 점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왜 하필 지금, 왜 이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나온다.
허경영 총재만이 아니다. 최근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 세무조사, 기부금 사용 내역 조사, 형사 기소 등 법의 잣대 앞에 서는 일이 잦아졌다.
법의 평등성은 당연하지만, ‘법치 만능’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법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허 총재의 무료급식소는 하루 한 끼에 의지하는 노숙인,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지도자가 수사와 재판에 묶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그 ‘밥상’이다. 따뜻한 국 한 그릇, 김 한 장, 밥 한 숟가락이 사라진 저녁은 곧바로 절망이 된다. 이 고통은 판결문에도, 뉴스 속 숫자에도 담기지 않는다.
“거리에서 하루 한 끼를 기다리는 이웃들은 법조문을 모른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밥 한 그릇과 사람의 온기다.”
종교인은 역사적으로 권력과 거리를 두면서도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지켜왔다. 그들의 나눔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됐다. 이 사랑이 끊어질 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법치도 공동체의 균열을 막지 못한다.
허 총재의 재판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나눔을 범죄로 볼 것인가, 보호할 가치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법은 정의를 지켜야 하지만, 정의는 때로 사람의 밥상 위에서 숨 쉬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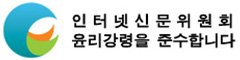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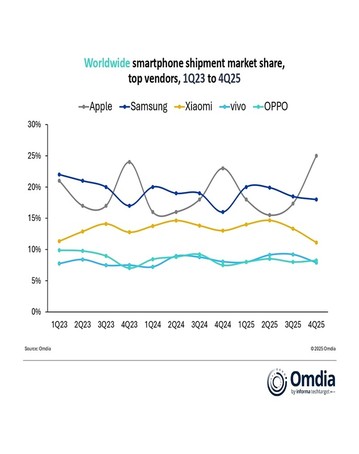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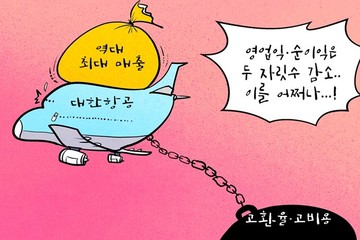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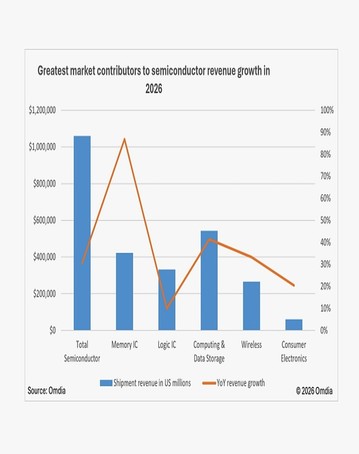
















![[포토]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한산한 버스 정류장](/news/data/20260114/p1065542639662240_806_h2.jpg)
![[포토] 주말 몰아친 강풍·폭설·한파에 전국 곳곳 피해…각종 사고로 8명 사망](/news/data/20260111/p1065541133837746_438_h2.jpg)
![[포토] 제야의 종이 울리며 '붉은 말의 해' 시작](/news/data/20260101/p1065545470543576_593_h2.jpg)




